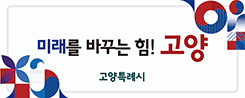|
지금도 4년 전 총선의 앙금[?}이 가시지 않았는데, 어느덧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경악을 금할 수 없었던 4년 전 선거보다 더한 이번 선거는 이제 익숙[?]한 길들여짐으로 반향이 적다.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선량[選良]들을 향한 위임과 대리로서의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 우려와 찬사가 긍정과 수긍의 저울대에서 균형을 잃은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시민의 집단 지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합리적 이념을 강 양편으로 나누어 정권 탈취만을 향한 돌격[?]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은 필자만의 망상일까. 다수의 유권자들의 외면 가운데 승패를 가른 이번 선거는 일반 시민들에게 승패도 그리 달갑지 않다는 걸 후보자 자신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못 궁금하고 또 궁금해진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 외쳤고,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설파했다. ‘저질’과 ‘악’을 넘어, 과연 유권자로서의 시민들의 투표 의무에 대한 가혹한 책임을 묻는 처절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무겁게 다가오는 건 필자뿐일까.
변화는 상승적이고 양가적[陽價的]인 것과 고착적이고 음가적[陰價的]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면 시민으로서 마땅히 전자를 택할 것이다. 고착[固着]은 불변을 뜻한다. 고정 관념은 편향으로 사람이나 집단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다.
선거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건 승패를 향한 정객들과 정당들의 치열한 패권에서 기인한다. 정당의 존재이유는 정권탈취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정객의 집단으로서의 정당이 이념의 집합체라면, 국민은 그 이념이 민주적[民主的]이고 민권적[民權的]인가에 깊은 이해와 파악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그 권리를 국민의 것으로 여기는 정객과 정당인가를 살피는 것이 유권자의 무거운 책임이고 막중한 의무라는 것이다. 지민[知民]일 필요성이 대두되는 절박한 시절이다.
금번 선거로 부천에도 정치적 인물의 변화가 찾아왔다. 크게는 인물교체이고 작게는 정당의 새로운 진입이다.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퇴거[退去]와 외지인들의 대거 진입이다. 지역을 대변한다는 정객들이 산지산출[産地産出]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안타까움과 불행일 수 있다. 지역을 모르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기 때문이다. 아니 산지 정객이라도 정당인이 아닌 정치적 신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당선증을 받고 등원을 기다리거나 이미 등원을 했다. 당선과 동시에 스스로가 주민들을 위한 약속을 잊는 폐습[弊習]을 또 경험할 것이다. 선택을 위한 투표에 대해 깊은 후보자의 자질과 주민을 위한 약속에 대한 깊은 살핌이 없거나 이념의 편향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주인인 주민의 투표책임은 참혹한 결과에 앞서 알아야할 의무도 무겁고 엄중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변화는 늘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진리는 자책[自責]과 부합한다.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